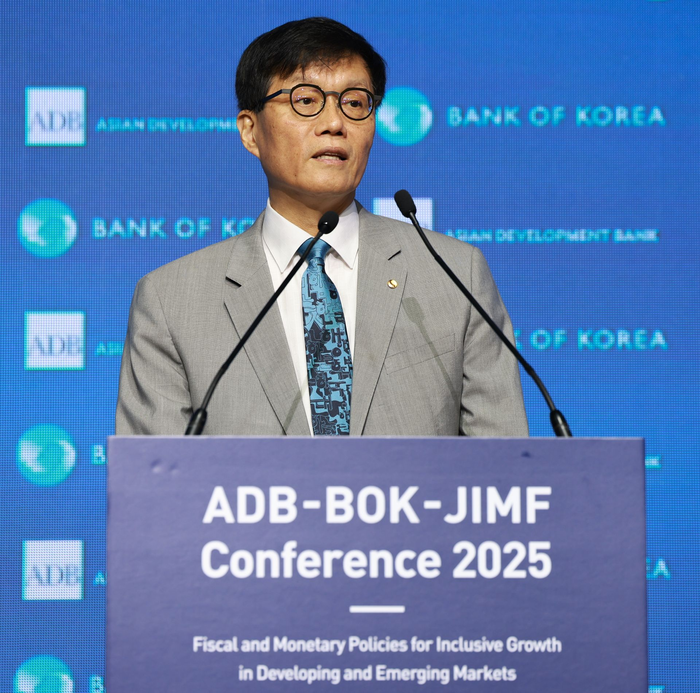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통화정책의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면서 고소득 가구일수록 물가 변동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사치재 가격이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황설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인플레이션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고소득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 시 더 크게 하락하고 완화적 충격 시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오는 17일까지 공동 개최한다.
황 연구위원은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사치재의 가격이 통화정책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 바스켓이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성돼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 역시 가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 “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가계가 직면하는 물가가 소득 분위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이때 사치재는 필수재보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수요 위축과 함께 가격 하락 폭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를 구축하고,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부호제약 방법을 사용했다.
이어 국소투영법을 활용해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응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했다.
그는 “가계가 속한 소득 분위에 따라 소비 바스켓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소득이나 자산가격 측면뿐 아니라 물가 측면에서도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재정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예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가 낮을수록 정부지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반대로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1%로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집계한 4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이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기축통화사용 국가에서도 부채 수준이 낮을 때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면서도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고부채 상태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제약될 수 있어, 정책 수립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