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폭 무관하게 충전식 공법 적용
액체방수 두께ㆍ방화문 성능도 문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원이 9년 만에 건설감정실무 개정에 나서면서 하자소송에서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새로운 하자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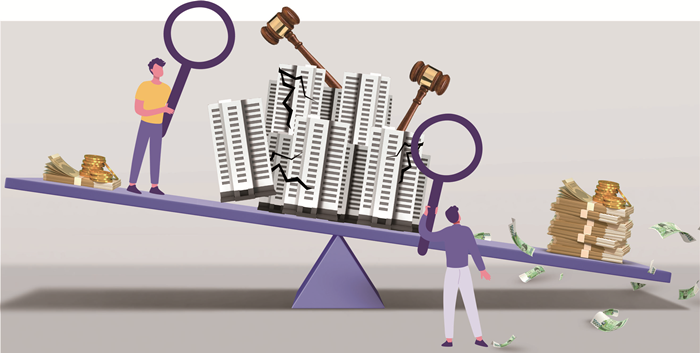 |
일부 하자 항목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이 나온 이후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개별 하자 항목 가운데 통상 보수비용이 가장 큰 ‘층간 균열’ 문제가 대표적이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한꺼번에 모든 층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콘크리트 특성상 한 층씩 쌓아 올리게 된다. 이때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 차이 때문에 위아래층의 콘트리트가 만나는 부분(층이음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 법원은 △층간 균열폭이 0.3㎜ 미만인 경우 접착제(퍼티)와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표면처리공법’을 △균열폭이 0.3㎜ 이상인 경우 균열 부위를 V자나 U자로 파내고 보수재를 채워 넣는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했다. 비용으로 따지면 충전식 공법이 훨씬 비싸 표면처리공법 대신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면 보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 과정에서 균열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도록 지침이 바뀐 이후 층간 균열에 대한 과잉 감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등은 콘크리트 균열폭이 0.3㎜ 이상이어야 하자로 판정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방수키 시공 여부와 층이음 부위의 중성화 여부를 확인해 구조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층간 균열이라도 0.3㎜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 적용을 인정하는 판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고법은 2022년 하자소송 2심에서 층간 균열 보수 방법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여전히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에서 정한 기준이 그렇다’는 점만 간단히 내세우며 피고(건설사)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분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짐에도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간단히 배척해 버리는 재판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아파트 하자 방지를 위한 공법 개선에 관한 건설업계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제를 물ㆍ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시공방법으로, 주로 욕실이나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된다. 과거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벽은 6~9㎜, 바닥은 10~15㎜’를 두께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1999년 개정 당시 두께 기준이 삭제됐고, 2013년 개정 이후부터는 벽ㆍ바닥 구분 없이 ‘성능 기준 최소 4㎜’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 하자소송에서 입주민 측이 ‘과거 표준시방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인이나 재판부마다 판단 기준도 다르다는 점이다.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서도 액체방수층 변경 시공과 관련해 “액체방수층의 두께 부족, 일부 방수층의 미시공과 같은 하자는 설계도면의 상세도와 시방서 등으로 판단한다”는 식으로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타일 뒷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명확하게 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하자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보수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이 개정판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음이나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 제연설비의 성능 하자, 아파트 창호 복층유리 안에 주입된 ‘아르곤 가스’의 함유율 부족 문제 등은 기존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